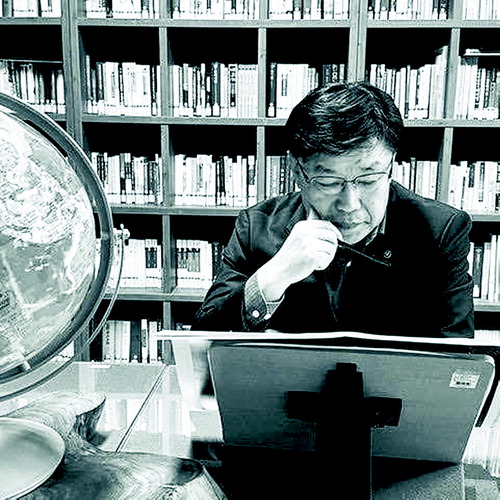윤동주의 벗, 설천 문항 출신 정병욱 교수 생가(生家) 복원과 함께 문학관 건립도 검토해야
정병욱 교수의 삶, 남해와 광양이 기억을 품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2025년 04월 25일(금) 09:54
|
한 편의 시(詩)는 어떻게 세상을 울리는가. 그리고 그 시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었을까. 윤동주의 유고시집(遺稿詩集)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순결한 시정(詩情)과 저항의 정신으로 한국 현대문학사(現代文學史)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집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사람의 벗, 학자, 그리고 민족문화의 수호자인 남해 출신 백영(白影) 정병욱(鄭炳昱, 1922~1982) 선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1922년 남해군 설천면 문항마을에서 태어난 정병욱 선생은 광양 망덕포구(望德浦口)를 거쳐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가 되기까지, 자신의 삶을 학문과 문학, 그리고 민족문화의 뿌리를 지키는 데 바쳤다. 그는 단지 윤동주(尹東柱) 시인의 벗만이 아니었다. 시대를 관통한 지성인이자, 오늘날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사람됨'과 '문화적 뿌리'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참스승이었다.
윤동주의 벗, 시(詩)를 지킨 사람, 정병욱 교수
1940년,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에서 만난 윤동주와 정병욱은 같은 기숙사 방을 쓰며 시와 삶,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자신의 시를 정리한 원고 세 권 중 한 권을 후배 정병욱에게 맡기며 "이건 꼭 지켜달라"고 당부한다. 1944년 일제 징용(徵用)으로 전장에 끌려가기 전, 정병욱은 이 소중한 원고를 어머니에게 "목숨처럼 귀중한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그는 다시 그 원고를 손에 넣는다. 마침내 이 원고는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다. 만약 정병욱 선생이 아니었다면, 윤동주의 시는 지금처럼 우리 곁에 살아 숨 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문학은 작가의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자'와 '기록하는 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병욱은 바로 그 조용한 영웅이었다.
우리나라 국문학의 토대를 세운 학자, 정병욱 교수
정 선생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고전 시가 연구의 기틀을 닦았다. 고려가요와 시조, 김시습 연구는 물론, 최치원(崔致遠)을 연구하던 중 <대동야승(大東野乘)>을 모조리 읽고 졸업논문을 쓰는 등 고전문학의 계보를 재정립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그는 판소리의 가치를 일찍이 인식하고 <판소리연구학회>를 창립했으며, '판소리 감상회'를 통해 대중이 고전예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의 저서 『한국의 판소리』는 학문과 예술의 간극을 좁히는 다리가 되었으며, 오늘날 판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오늘의 교육, 정병욱 교수에게 묻다
정병욱 선생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되묻고 되새겨야 할 교육(敎育)의 본질(本質)을 보여준다. 경쟁과 효율, 결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의 깊이와 문화의 뿌리를 품는 교육이 절실한 지금. 정병욱 선생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윤동주의 시를 가슴에 새기게 한 그런 스승을,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얼마큼 만나고 있는가. 교육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지키고 되새길 수 있는 '깊이'라는 사실을 그는 삶으로 증명했다.
남해와 광양, 기억을 품은 공간으로 거듭나야!
정 선생의 삶은 남해 설천 문항마을에서 시작해, 광양 망덕포구를 지나 부산과 서울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의 삶의 뿌리이자 출발점이었던 문항마을의 생가(生家)는 지금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더 늦기 전에, 다양한 문헌 자료와 마을 주민들의 구술 증언을 토대로 생가 복원 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 아울러 광양 망덕포구와 설천 문항마을을 하나의 문화 축으로 연결하는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두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기억의 공간은 단순히 기념비를 세운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문화, 주민 참여가 어우러져야 진정한 '기억의 장소'가 된다. 정병욱 선생의 생가(生家)는 단순한 기념관이 아닌, 문학과 교육, 전통을 계승하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또한 고전문학 체험 프로그램, 판소리 감상회, 청소년 문학 캠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생가(生家)가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제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생가 복원과 문화 콘텐츠 개발은 마을이나 면 단위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 남해는 정병욱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인을 배출한 문화의 고장이다. 이른 시일 안으로 생가를 복원하고, 또한 이를 계기로 문항마을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학관(文學館) 건립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유명 인물의 흔적'이 아닌, '문화를 지키고 전한 사람의 숨결'이 살아 있는 미래형 문화관광 자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광양과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양 시·군이 함께 개발하고, 지역 학생들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두 지역을 잇는 '지성의 길'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미래를 세우는 일이다. 남해와 광양이 함께 기억을 품고, 이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역사와 문화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끝으로 정병욱 선생의 삶은 문학과 우정, 교육과 민족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이 어우러진 숭고한 여정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삶의 지표이자, 가치의 척도다. 윤동주의 시가 그러했듯, 정병욱의 이름 역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오래도록 살아 있어야 한다. 남해와 광양, 그리고 이 시대의 교육은 그의 이름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윤동주의 벗, 시(詩)를 지킨 사람, 정병욱 교수
1940년,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에서 만난 윤동주와 정병욱은 같은 기숙사 방을 쓰며 시와 삶,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자신의 시를 정리한 원고 세 권 중 한 권을 후배 정병욱에게 맡기며 "이건 꼭 지켜달라"고 당부한다. 1944년 일제 징용(徵用)으로 전장에 끌려가기 전, 정병욱은 이 소중한 원고를 어머니에게 "목숨처럼 귀중한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그는 다시 그 원고를 손에 넣는다. 마침내 이 원고는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다. 만약 정병욱 선생이 아니었다면, 윤동주의 시는 지금처럼 우리 곁에 살아 숨 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문학은 작가의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자'와 '기록하는 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병욱은 바로 그 조용한 영웅이었다.
우리나라 국문학의 토대를 세운 학자, 정병욱 교수
정 선생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고전 시가 연구의 기틀을 닦았다. 고려가요와 시조, 김시습 연구는 물론, 최치원(崔致遠)을 연구하던 중 <대동야승(大東野乘)>을 모조리 읽고 졸업논문을 쓰는 등 고전문학의 계보를 재정립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그는 판소리의 가치를 일찍이 인식하고 <판소리연구학회>를 창립했으며, '판소리 감상회'를 통해 대중이 고전예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의 저서 『한국의 판소리』는 학문과 예술의 간극을 좁히는 다리가 되었으며, 오늘날 판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오늘의 교육, 정병욱 교수에게 묻다
정병욱 선생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되묻고 되새겨야 할 교육(敎育)의 본질(本質)을 보여준다. 경쟁과 효율, 결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의 깊이와 문화의 뿌리를 품는 교육이 절실한 지금. 정병욱 선생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윤동주의 시를 가슴에 새기게 한 그런 스승을,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얼마큼 만나고 있는가. 교육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지키고 되새길 수 있는 '깊이'라는 사실을 그는 삶으로 증명했다.
남해와 광양, 기억을 품은 공간으로 거듭나야!
정 선생의 삶은 남해 설천 문항마을에서 시작해, 광양 망덕포구를 지나 부산과 서울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의 삶의 뿌리이자 출발점이었던 문항마을의 생가(生家)는 지금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더 늦기 전에, 다양한 문헌 자료와 마을 주민들의 구술 증언을 토대로 생가 복원 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 아울러 광양 망덕포구와 설천 문항마을을 하나의 문화 축으로 연결하는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두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기억의 공간은 단순히 기념비를 세운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문화, 주민 참여가 어우러져야 진정한 '기억의 장소'가 된다. 정병욱 선생의 생가(生家)는 단순한 기념관이 아닌, 문학과 교육, 전통을 계승하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또한 고전문학 체험 프로그램, 판소리 감상회, 청소년 문학 캠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생가(生家)가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제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생가 복원과 문화 콘텐츠 개발은 마을이나 면 단위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 남해는 정병욱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인을 배출한 문화의 고장이다. 이른 시일 안으로 생가를 복원하고, 또한 이를 계기로 문항마을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학관(文學館) 건립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유명 인물의 흔적'이 아닌, '문화를 지키고 전한 사람의 숨결'이 살아 있는 미래형 문화관광 자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광양과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양 시·군이 함께 개발하고, 지역 학생들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두 지역을 잇는 '지성의 길'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미래를 세우는 일이다. 남해와 광양이 함께 기억을 품고, 이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역사와 문화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끝으로 정병욱 선생의 삶은 문학과 우정, 교육과 민족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이 어우러진 숭고한 여정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삶의 지표이자, 가치의 척도다. 윤동주의 시가 그러했듯, 정병욱의 이름 역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오래도록 살아 있어야 한다. 남해와 광양, 그리고 이 시대의 교육은 그의 이름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